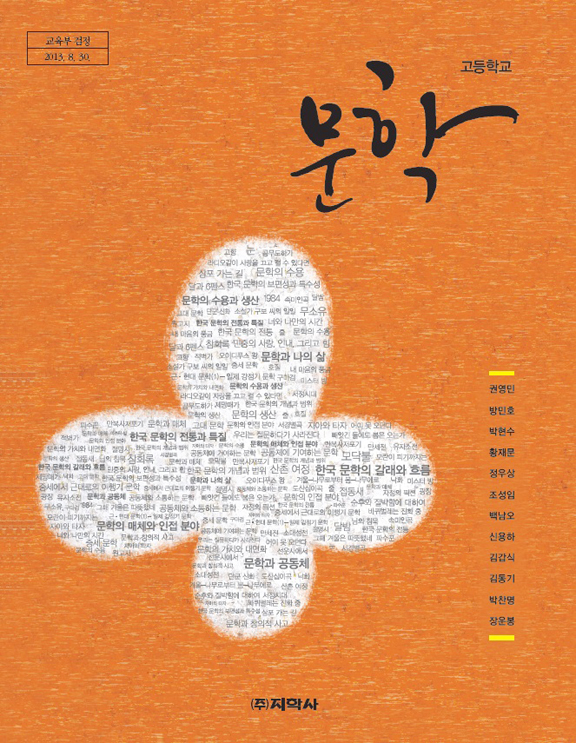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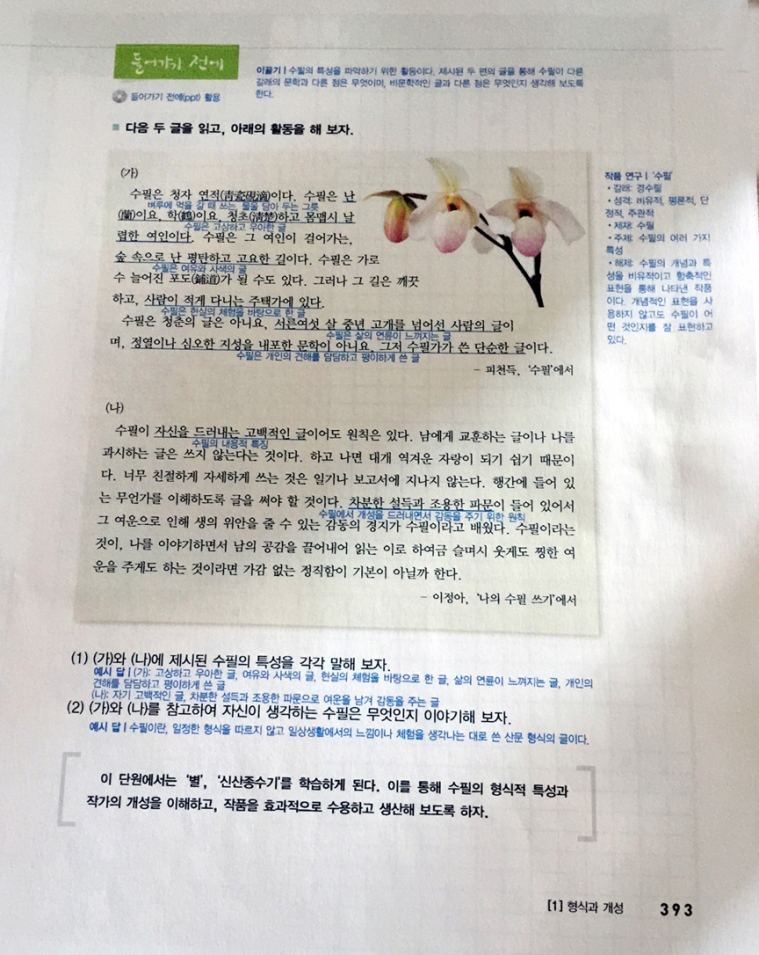
나의 수필쓰기
이 정 아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문사 주최의 글짓기 대회에 나간 적이 종종 있었다. 주로 경복궁에서 사생대회와 함께 열리곤 했는데 과거장에 시제가 출제되듯 두루말이에 쓴 제목이 늘어지는 순간엔 가슴이 몹시 뛰었던 기억이 새롭다. 시 부문과 산문 부문이 있었는데 나는 주로 산문 부문에 출전했었다.
시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서가에 가득했던 시집들을 글자를 깨우쳤을 때부터 뜻도 모르고 읽었었다.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읽어보아도 시는 어렵고, 내 뜻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면 많은 수련(?)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난해한 시들이 범람하는 요즈음, 어릴 적 내 생각이 옳았다는 기분이 더 하다. 그래서 요사이 시집을 구입할 때도, 뒤적거려 본 후 이해 가능한 잔잔한 감동이 있는 시가 들어있는 시집에 손이 가곤 한다.
소설은 아무래도 작가의 체험이 많이 바탕이 된 허구이겠으나 읽다보면 주인공이 작가 자신이 아닐까 확신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소설 쓴 이를 나름대로 어떤 인물로 확정지어 놓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긴 순전한 나의 선입견 때문이긴 하지만 문단 사람들과 교우 하다보면 그 생각이 배반당하는 일이 자주 있다. 소설은 소설,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이쯤 되면 수필에 대한 나의 생각이 거의 표현된 셈이겠다. 나는 글쓴이와 글은 동격이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께 수필을 쓰는 분들과도 종종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 작금의 추세는 겪지 않은 것도 상상을 가미해 수필화 할 수 있다나? 물론 가보지 않은 곳은 기행문이나 비디오의 화면을 빌려서 본 간접체험을 쓸 수는 있다. 옛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시대의 인물들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당연히 책을 통한 간접지식으로 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제 삶을 표현할 때는 어디서 인용해 쓸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때문에 융통성 없는 나의 글 속에 종종 등장하는 가족과 친구들 또는 교우들과 이웃으로부터 가끔 불평의 소리를 듣는다. “저이 앞에서는 조심해야 해, 잘못하면 글에 오를 수 있으니까." 가끔 우스갯소리로 주위 분들이 하는 말이다.
뒤늦게 글쓰기를 시작한 내게 아버지는 매일매일 글쓰기를 연습하라고 하셨다. 글쓰기에 선천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 수 없다며. 마치 운동선수가 하루라도 연습을 빼 먹으면, 근육이 뭉치고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듯이… 그래서 홈페이지에 일 주일에 한 번씩은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 한 달에 4편 정도의 수필은 쓰도록 나와 약속이 되어 있는 셈이다.
수필이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적인 글이어도 원칙은 있다. 남에게 교훈하는 글이나 나를 과시하는 글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고 나면 대개 역겨운 자랑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너무 친절하게 자세하게 쓰는 것은 일기나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 행간에 들어 있는 무언가를 캐치하도록 글을 써야 할 것이다. 차분한 설득과 조용한 파문이 들어 있어서 그 여운으로 인해 생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감동의 경지가 수필이라고 배웠다. 수필이라는 것이, 나를 이야기하면서 남의 공감을 끌어내어 읽는 이로 하여금 슬며시 웃게도 찡한 여운을 주게도 하는 것이라면 가감 없는 정직함이 기본이 아닐까 한다.
어릴 적부터 익숙한 나의 산문에 솔직히 말하면 나의 잡문에 고개 끄덕여 주면서 ‘수필' 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 주시는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쑥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래전 (2007)한국 수필작가회
20주년 기념문집에 실렸던 글인데 그걸 찾아 실으신
분들이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올려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