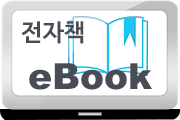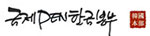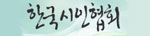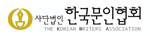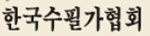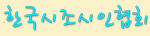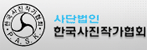생산성 낮아 일제가 거의 멸종시켜
몸통 크고 육질 질긴 짝퉁이 판쳐
90년대 유전자 찾아내 복원 작업
마트용 실용닭, 재래닭으로 상품화
1994년부터 ‘청리’ 토종닭을 키워 온 박대환(경기도 이천) 생산자에게 물었다. “토종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무슨 성분이 많아 몸에 좋다, 토종은 우리 거라 무조건 좋다 등을 예상했다. 의외의 답변이 나왔다.
“취소성(就巢性·broodiness)입니다.” 취소성은 조류가 알을 품으려는 성질이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두견과( 뻐꾸기 등)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류의 본능이다.
청리 토종닭의 계란 노른자는 비린 맛 없이 고소하다.
. 모성 본능이 강한 토종 암탉은 알을 낳으면 가슴 털이 빠지거나 일주일 정도 먹이도 잘 먹지 않는다. 취소성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약점이다. 산란계(알을 생산할 목적으로 육종한 닭)는 취소성이 사라져 알을 낳아도 토종닭처럼 털이 빠지거나 먹이를 먹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생산성도 좋다. 산란계 한 마리가 연간 290개 내외로 산란을 한다. 반면 토종닭은 140개 안팎에 그친다. 같은 사료를 먹여도 토종닭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낳은 계란도 산란계가 낳은 크기의 60%에 불과하다. 경제논리로 보면 토종닭은 시장에서 버티기 어렵다. 그런 까닭으로 20세기 초부터 도태의 길을 걸었다.
토종닭은 멸종 위기까지 갔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농축산물을 조사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개체들을 도태시켰다. 일제가 도입한 외래 품종에 의해서도 밀려났다. 한국전쟁을 겪은 뒤 ‘원조’라는 명목하에 들어온 외래종은 토종닭을 멸종 상태에까지 이르게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토종닭을 찾자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가 폐계(산란을 하다 알 낳는 능력이 저하된 암탉)나 교외 식당 마당에서 키우는 커다란 외래종을 토종닭인 양 공급했다. 큰 몸통을 가진 가짜들은 질겼다. 그 덕에 ‘토종닭은 질기다’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와 민간에서 토종닭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소득 수준 향상으로 맛있는 닭에 대한 수요도 있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 토종닭 순종을 찾는 것과 순종을 개량해 실용성 있는 품종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복원된 토종닭은 크게 실용계와 재래닭 두 가지로 나뉜다. 실용계는 ‘한협 3호’ ‘우리맛닭’이 있다. 토종닭의 단점인 경제성을 보완한 품종이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토종닭이 바로 실용계다. 재래닭(청리·고센·제주재래닭·현인닭·연산오계 등)은 지역에 있던 것들을 복원하거나 품종 관리(연산오계는 8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를 한 것이다. 사라진 토종닭 순종을 복원하는 것은 종로에서 김 서방 찾듯 유전자 하나하나를 찾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청리 토종닭을 예로 들면 90년대 여경수 영남대 교수가 농촌진흥청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국내에는 외형에 대한 자료조차 없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축산(27년 발행)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했다. 조선에서 재래닭을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 경북 상주군 청리면 수상리로 기록돼 있다. 복원된 토종닭의 명칭을 청리로 한 까닭이다. 유전자 연구를 통해 복원했지만 1900년대 초 이전의 닭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토종닭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 1900년대 초의 닭도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초의 닭과 다를 수 있다. 현재 토종닭은 ‘100% 외래종’과 구분 짓는 용어라 생각하면 된다. 우리맛닭·연산오계 등은 한국 고유 품종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돼 있다.
토종닭을 애써 복원한 이유는 식재료의 첫 번째 미덕인 ‘맛’ 때문이다. 토종닭이 낳은 계란은 한결 맛있다. 삶은 계란 노른자를 먹어 보면 닭 비린내 없이 고소하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린다. 노른자를 싫어하는 어린이라도 토종란 노른자는 거부감 없이 잘 먹는다. 아이들 입맛은 어른들이 강제할 수 없는, 맛있는 것을 찾는 정직함이 있다. 육질은 외래종으로 사육한 육계(고기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와 식감이 다르다. 씹는 맛의 차이는 콜라겐 함량 차이다. 육계보다 10% 이상 높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닭 가슴살은 퍽퍽하다. 먹는 게 고역이다. 육계의 가슴살은 성장 위주로 특화돼 탄력이 부족하다. 육계는 45일 내외면 출하를 한다. 토종닭은 최소 60일에서 90일이 필요하다. 성장이 육계에 비해 더디다. 더딘 성장은 살에 탄력을 준다. 가슴살이 퍽퍽하지 않고 씹는 맛이 있다. 육계보다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도 35% 이상 많다.
토종닭으로는 프라이드치킨을 할 수 없다고들 생각한다. 가격도 부담이지만 질기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필자도 2000년에 이른바 ‘토종닭’을 먹었을 때 질긴 식감에 놀랐다. 고무를 씹어도 그보다는 연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실용계 토종닭이나 재래닭을 먹으면서 그전에 잘못 먹었음을 알았다. 복원된 토종닭은 질기지 않다. 현재 튀겨서 먹는 닭의 식감이 너무 연한 데다 전에 사기당해 먹었던 폐계 닭이 질겼을 뿐이다.

필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다. 2003년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다. 아빠 직업이 식재료와 관련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한협 3호 등 토종닭을 많이 먹었다. 물론 치킨도 먹었지만 백숙·닭볶음탕 등 집에서 하는 요리는 토종닭을 재료로 썼다. 최근 바삐 지내다 보니 토종닭을 준비 못해 육계로 닭볶음탕을 해 준 적이 있다. 첫마디가 “닭 맛이 별로야!”였다. 평소와 다른 식감을 단번에 알아챘다. 재래닭으로 백숙을 할 때 요리법은 간단하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소금과 마늘 두어 쪽이면 된다. 잡내가 없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할 부재료가 필요 없다. 백숙을 하면 조금 노란 기름이 뜰 뿐 국물이 맑고 깔끔하다. 닭볶음탕도 살 자체에 맛이 있기 때문에 마늘이 많이 필요 없다. 단지 마늘이 빠지면 국물의 힘도 빠지기 때문에 조금만 넣으면 된다.
중식 대가의 솜씨를 빌려 토종닭을 튀겼다. 중식요리점 ‘진진’(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대표 왕육성 사부와 함께 한협 3호, 우리맛닭, 제주재래닭을 테스트했다. 튀김한 닭에 매콤하게 양념을 한 라조기, 튀긴 닭을 양념해 다시 찌고 간장으로 양념하는 궈사오지(鍋燒鷄) 등의 요리를 했다. “요리에서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7할이다.” 요리를 해 주신 대가의 평이다. 그만큼 평소에 다뤘던 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이었다.
다만 가격이나 공급의 지속성이 문제다. 일식 꼬치를 전문으로 하는 쿠이신보(서울 마포구 합정동)도 한동안 우리맛닭으로 요리를 내다가 그만뒀다. 들쭉날쭉한 공급도 문제지만 육계와 달리 부분육으로 공급되지 않아 일일이 손질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었다.
. 지난한 육종 기간을 거쳐 품종이 확립됐지만 우리가 즐기는 음식의 종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푹 삶는 요리법밖에 없다. 다양한 요리법 개발에 필수인 닭의 부위별 공급 또한 부족하다. 좀 더 다양한 요리법의 개발과 공급체계가 아쉽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삼계탕을 즐겨 찾는다. 춘천에 가면 매운 닭불고기도 꽤 잘 먹는다. 특히 치맥(치킨+맥주)은 중국인들에게는 기본 코스가 됐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서 찾아 먹는 닭고기는 조리법만 다를 뿐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한 품종의 닭이다. 널리 퍼진 음식들의 재료를 토종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닭을 그들에게도 익숙한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것 말이다. 많이 접해 본 요리를 통해 한국의 식재료를 알리는 것도 한식을 홍보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