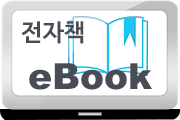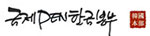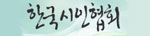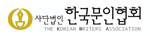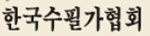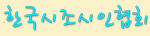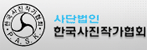"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 메이뇨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돋는 나라“

촬영: 조지 아치볼드, 1979년 1월 파주 대성동 DMZ, 우리나라 마지막 따오기 모습
아마도 50대 이상이면 들어봤을 동요 따오기입니다. 노래에 나올 정도라면 우리 주변에서 흔했을 텐데요, 1979년 1월 경기도 파주 대성동 DMZ에서 1마리가 사진에 찍힌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이 땅에서 따오기는 볼 수 없었습니다.
따오기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캐나다인으로 국제 야생조류 보호운동가인 국제두루미재단(ICF;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설립자 조지 아치볼드 박사입니다. 그가 찍은 사진은 이 땅의 안타까운 따오기 멸절 기록입니다.
당시 우리 사회엔 새마을 운동, 수출입국, 중화학공업 육성, 10월 유신, 한국적 민주주의, 국민총화 등등의 용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도시로 인구가 몰려 농촌은 비어갔습니다. 농업 생산 늘린다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들이붓는 논에 따오기 먹이인 미꾸라지, 새우가 살아남을 리 없습니다. 경제 개발, 성장의 그늘 아래 자연은 파괴되고 환경은 오염됐습니다. 따오기가 사라진 원인과 배경입니다.
그런 따오기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는 4일부터 경남 창녕군이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증식한 따오기를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지난 2008년 10월 중국에서 데려온 1쌍이 이듬해인 2009년에 알을 낳아 새끼 2마리를 얻은 뒤로 따오기는 점점 불어나서 8년 만인 현재 171마리까지 늘었습니다. 같은 부모의 자손끼리 번식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 2013년에 중국에서 수컷 2마리를 새로 맞아들였습니다.
덕분에 2014년부터는 번식 개체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 내년 10월 따오기를 우포늪 주변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창녕군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자연 복귀 대상 따오기 20마리를 골라 사람과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 공개를 한다고 복원센터 김성진 박사는 설명합니다. 복원 사업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자유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예약을 통해 50명씩 하루 4차례, 1시간 동안 따오기와 우포늪에 관한 해설을 듣고 전시용 새장(케이지)을 관람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 데려온 따오기 부부 룽팅(龍亭, 수컷)과 양저우(洋州, 암컷)
따오기 복원은 11년 전, 2005년에 야생조류 연구 권위자인 고 김수일 한국교원대 교수의 제안이 계기가 됐습니다. 국제사회 보호단체와 연구가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내 자연보호 활동가들이 2007년에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미 복원에 성공해 자연에서 따오기가 사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2008년 8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한중 정상 간에 따오기를 주고받는 MOU에 서명하면서 따오기 도입은 급진전을 이뤘고, 같은 해 10월 중순 중국 따오기 수컷 룽팅(龍亭)과 암컷 양저우(洋州) 부부가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마침 습지보전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경남 창원에서 열리기 직전이어서 습지와 습지에 사는 다양한 생물에 관해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큰 뉴스가 됐습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따오기를 주고받음으로써 한국과 중국은 우의를 다지고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따오기 자연 방사를 1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따오기가 먹이를 구하며 살아갈 공간인 무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300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므로, 먹이터가 될 무농약 재배 논이 29ha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논은 6.9ha정도에 불과합니다. 우포늪 주변 농민들은 벼농사보다는 돈이 더 들어오는 양파, 마늘 재배에 힘을 기울입니다. 따오기 복원 정착에 도움 되는 무논을 늘리려면 농민들을 설득해서 친환경 논을 유지하도록 금전적인 보상 체계도 세워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20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간 뒤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하고 연구를 확대해야 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날개 달린 새가 사람이 마련해 준 곳에만 머물러 살지는 않을 것이니 지자체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 연구기관의 협력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창녕군과 경상남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녕 우포따오기복원위원회 이인식 위원장을 비롯한 자연 생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환경부의 노희경 생물다양성과장은 이제까지 정부 지원이 시설 설치비 위주였다면서, 따오기 서식지가 될 무논을 늘리는 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 (조감도)
환경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창녕군수는 내년 10월 따오기 자연 복귀 행사에 참석해서 나란히 새장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 자체가 아니라, 행사 뒤에 따오기들이 굶주리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따오기 복원을 동아시아 자연 생태 보전과 서먹한 한-중-일 관계 회복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 새를 우리나라에 보내 준 중국, 역시 중국으로부터 따오기를 데려와 우리보다 앞서 자연 복원에 성공한 일본의 고위 인사와 학자, 시민들을 내년 복원 행사에 초청해 동아시아 따오기 원탁회의를 열 수 있지 않을까요? 따오기가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공존의 상징, 동아시아의 우의와 평화의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